‘모나코’는 다소 호불호가 있을법한 옛스런 로맨스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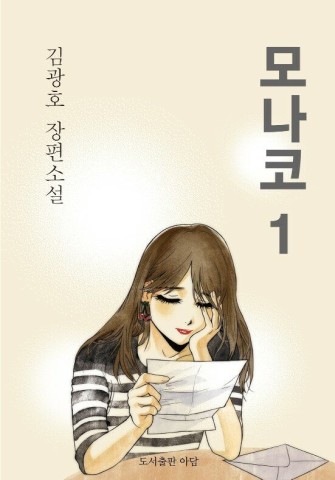
무려 70년대부터 현대에 걸친 사랑을 그린 이 책은, 한때 전국의 청춘들을 사로잡으며 크게 유행했다가 지금은 잘 보기 어려운 정통 멜로를 표방한 소설이다.
그래서인지 읽다보면 옛 추억이나 감성을 떠올리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꽤 성공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겠다.
무려 20년에 걸친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보니 과거 이야기의 분량도 꽤나 많은데, 7, 80년대가 워낙에 사회적으로 강렬했던 시기이기도 했던데다 주인공들이 한창 어리석은 젊음을 뜨겁게 불태우던 때이기도 해서다. 과거를 주요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지 요즘이라는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고 이제는 다소 클리셰처럼 식상해진 관계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요소들은 그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련한 마음이 들게도 하지만, 접점이 없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것일 수 있다. 소설을 좀 옛스러워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이야기도 다소 그렇다. 쉽게 말하면 좀 뻔하다는 거다. 조폭이 겉 모습이나 살아가는 세계와는 달리 (심지어 일반인들은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것에 반해) 순수하다 할만한 순애보를 보인다는 것도 그렇고, 조폭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격하게 거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변치않는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도 그렇다.
그렇기에 더욱 그 과정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했는데, 전개 면에서는 꽤 아쉬움이 남는다.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관계가 바뀌게 되는 사건 등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대사 등이 ‘다양한 일면을 가진 복잡한 캐릭터’라고 치부하기에도 다소 급발진적인 면이 있어서 핍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설사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공감점이 없었다.
두 주인공을 모두 각기 1인칭으로 그린 것도 좀 걸렸는데, 두 사람의 이야이가 번갈아 나오거나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표기된 것이 아니다보니 각 장이 시작될 때 누구의 이야기인지 먼저 파악하는 수고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괜히 번거롭달까.
양쪽의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감정이입이 지속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는 단점도 있다. 차라리 ‘김범주’의 시점으로만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뻔하더라도 지극한 순애보를 가진 한 남자의 사랑이야기로 일관되게 읽혔을거다.
때때로 전지적 작가같은 이해를 보이거나 제3의 벽을 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굳이 1인칭일 필요가 있었나 싶게 하는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