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서’는 왁싱숍에서의 의문의 살인을 추적해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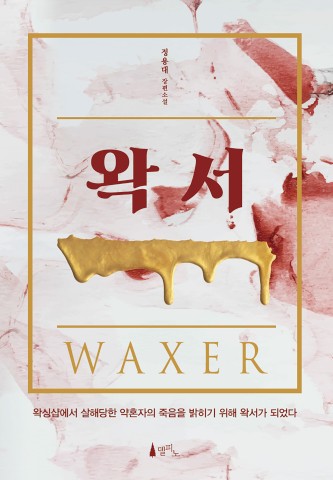
책을 보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왁싱과 사건을 어떻게 연결했을지, 또 그걸 등장인물들의 서사로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거였다.
그런 점에서 꽤나 훌륭한 연결점을 만들어 보여준 것에는 먼저 칭찬을 하고 싶다. 왁싱의 이모 저모를 얘기하면서, 그를 통해 왁싱 업계에서 일류가 되는 것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주인공들이 일류가 되어가는 것도 그럴듯하게 보여주었고, 그러는 와중에 사건의 전모도 왁싱과 관련하여 나름 잘 풀어낸 점이 좋다.
여러 인물들로 시점을 마구 오고간다는 서술적인 측면의 아쉬움이나,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이정도면 소재를 꽤 잘 소화해냈다고 할만하다.
문제는, 주요 소재가 왁싱인데도 막상 그렇게 비중있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다. 대부분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어있고, 어째선지 모를 허점 2% 정도만을 채우는데 왁싱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좋게 봐준다면 그 2%가 중요해서 일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세부에서 허술함이나 의문스러움을 남기기에 왁싱이 전혀 계획의 화룡점정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심지어 뒤로 갈수록 핍진성이 떨어져 마무리에 이르러서는 다소 작가 편의적이라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후반의, 마치 보여줄게 바닥났다는 듯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이야기들은 더더욱 ‘충분히 그럴만도 하지’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돼?’, ‘이러면 되는 거 아냐?’라거나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케 함으로써 초중반 보여줬던 소재의 소화력을 까먹으며 결국 아쉬움이 남게 한다. 좀만 더 채워넣고 다듬어 보지.
이야기 외적으로도 어색한 문장, 이상한 문장, 도저히 한국어가 아닌 잘못된 문장 따위가 너무 많은 것도 불만스러웠다. 설마 이런게 의도적으로 쓴 건 아닐텐데. 교포 2세나 3세가 자비 출판을 한 것도 아닌데 작가 뿐 아니라 편집부에서까지 이런 걸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퇴고와 교정이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한다. 작품 자체와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마이너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