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즈 사강(Françoise Sagan)’의 ‘마음의 푸른 상흔(Des bleus à l’âme)’는 한 남매의 이야기와 한 작가의 에세이를 담은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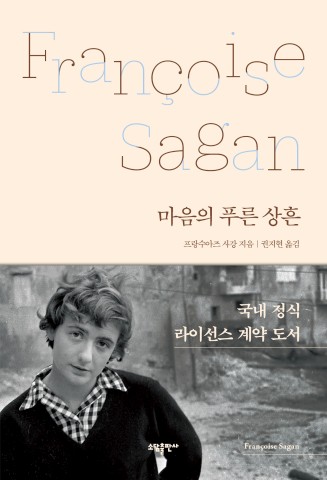
소설은 꽤나 독특한 형식을 하고 있다. 남매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이야기가 더불어 나오는데다, 이 작가가 남매의 이야기를 집핑중인 작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극과 극 밖을 마구 넘나들기 때문이다.
작가의 집필활동과 그 과정에서의 고뇌 등을 얘기하고, 그 결과로써 만들어진 소설을 연재본처럼 보는 것처럼 조금씩 이어 보는것은 꽤나 독특한 느낌을 준다.
남매의 이야기가 전형적인 소설처럼 느껴진다면, 작가의 이야기는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에세이 같다. 그래서, 비록 남매와 작가의 생존기를 그렸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은 꽤나 안어울려 보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 남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연관성을 언급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딱히 둘 사이에 별 연관성이 없어보여서다.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작가와 함께 소설 집필 여정을 함께 하는 듯한 느낌은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즐거움이 될 만도 하다.
두 이야기에 조금은 거리를 둔 채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하던 소설은 후반부에 등장인물의 비중이나 두 이야기의 관계 등이 달라지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이게 은근히 강타를 때린다. 아. 그래서 이런 제목이었구나.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고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