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꽃’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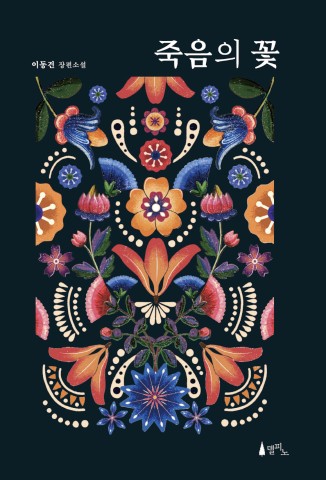
만약, 자신에겐 너무도 확고한 신념이 있으며 그것은 설사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어쩌면 이 소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소설 소개글에서도 얘기하고, 소설 내에서도 바로 앞 부분에서 말을 꺼내는, 바로 그 질문, 만약 인류의 구원자와도 같은 업적을 이룬자가 희대의 연쇄 살인마라면, 그래서 그가 자신의 업적을 공개하는 대가로 무조건적인 사면을 요구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 이 소설의 알파이자 오메가, 처음이자 끝, 그야말로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단지 그것을 장황한 이야기란 살을 덧붙여 방대하게 늘려놓은 것일 뿐이다.
저자는 이 핵심 질문에 자칫 해가 될 수도 있을만한 짓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영환’의 업적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 같잖은 논리를 내세우며 그럴듯해 보일려는 시도를 애초부터 하지 않는 점만 해도 그렇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빠진 부분, 그렇기에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말이 안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좀 있다. 애초에 대전제부터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유형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소설이 원래 의도했던 바, 즉, 무엇이 옳으냐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끝까지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 없이 잘 유지된다.
나름 사연과 개성이 있고, 그렇기에 각자 다른 선택을 보이는 등장인물들은 그것을 더욱 부각해서 보여준다. 또한 단순한 질문일 때는 자칫 무시하기 쉬운 복잡한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니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처음의 니 생각, 신념이 계속 될까? 라며 조금씩 긁어댄다.
그런식으로 질문을 강화하기만 하고 끝낸 것은 끝까지 컨셉을 잘 지켰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만하다. 주인공을 하나로 좁히지 않은 것도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데는 적합했다.
다만, 그것은 관심과 묘사를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누군가에게 이입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고, 이야기 역시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평이하다.
그래도 소설인데, 다 보고 나서 남는게 단지 생각할거리 뿐이라는 것은 역시 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