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칼 호수’는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그린 일종의 가상역사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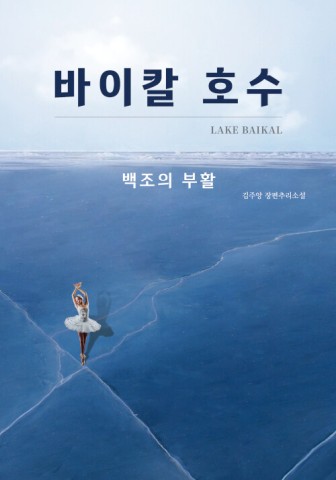
먼저 얘기해두고 싶은 것은, 이 소설은 딱히 닥터 지바고의 후속작이라고 할만한 건 아니라는 거다. 공식적으로 닥터 지바고의 후속작으로서 쓰인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이야기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닥터 지바고 본인과 그 주변인물이 등장하고, 시대배경상 그 뒤의 이야기를 그리고는 있긴 하다만 전혀 별개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
‘추리소설’이라는 것에도 별로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게 좋다. 딱히 파헤쳐내야 할 비밀이랄만한 것도 없고, 그것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일종의 가상역사 소설, 시대소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러시아 혁명으로 도주하던 25만명의 사람들이 동사했던 사건과 스탈린 시대의 황금 찾기를 소설은 꽤 재미있게 엮어냈다.
러시아 혁명 시기의 소련도 꽤 잘 보여준다. 러시아가 어떻게 소련이란 공산주의 국가로 변해가는지, 무려 혁명이란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부패해가며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그에 휩쓸리고 동조하게 되는지도 그럴듯하다.
특히 권력과 욕망에 충실한 악인을 잘 그렸는데, 이런 점들이 이 소설을 나름 괜찮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아쉬운 것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지바고 ‘예브그라프(약칭 그라샤)’와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다. 어색하거나 의문을 남기는 지점들이 꽤 있어서다.
일종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그라샤’가 ‘레다’를 외면하는 장면부터가 그렇다. 그토록 사랑한다더니, 어떻게 그렇게 한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소설은 비록 그 가능성을 엿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납득이 갈만한 이야기와 전개로 독자에게 전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문제는 끝까지 계속되서, 주요하게 알아보려던 일을 몇년이나 내팽개쳐놓는가 하면, 급작스레 상황과 장면이 전환되어 미싱링크를 느끼게 하기도 한다. 다분히 종교적이며 기적적인 장면 역시 좀 황당하다.
이런 점들이 소설을 괜찮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정도 볼만한 이야기 정도에 그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