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지에 오비오마(Chigozie Obioma)’의 ‘어부들(The Fishermen)’은 굳이 말하자면 감탄이 나오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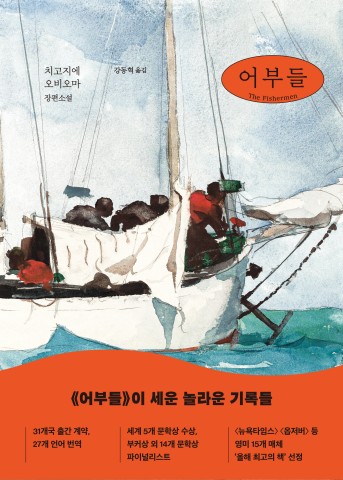
보통은 소설을 읽고 나면 이 소설은 어떻다고 대략 정리가 되는 편이다. ‘설정이 아까운 졸작’이라거나, ‘안타까운 후속작’이라거나, ‘배경과 캐릭터 설정, 거기에 묘사마저 훌륭하다’던가, 하다못해 ‘별 것 없는데도 몰입하게 하는 흡입력이 대단한 소설’이라는 식으로라도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소설은 뭔가 하나를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걸 얘기하면 저게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저걸 거론하면 너무 그런 소설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다.
이 소설은 여러 면에서 복합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소위 ‘그리스식 신탁’으로 대표되는 피할 수 없는 예언이다. 어쩌면 평범하고 그렇기에 평화롭기도 했던 한 가정에 어느날 예기치않게 던져진 예언으로인해 파탄을 향해가는 이야기는 꽤나 고전적이다. 이것이 비록 수십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대를 배경으로 벌어진다는 것이 의아해 보일 수 있으나, 저자는 그것을 나이지리아의 한 부족과 그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잘 그려냈다.
아직 완전히 현대화되지 않은, 어느 정도 서구 문물에 대한 동경 뿐 아니라 미신 역시 공존하고 있는 사회는 미친 소리라며 가볍게 넘길만한 얘기도 더 크게 느껴지게 하며,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이 처한 환경과 겪게되는 경험 등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별 어색함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이야기를 풀어놓는 순서도 신경써서 배치했다.
소설에 대해 좀 더 파고들어보면 어느 정도 나이지리아의 상황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도 접할 수 있는데, 들어보면 꽤나 그럴듯하고 혹하기는 한다만, 이건 앤간해서는 좀처럼 알아채기 어려운 얘기다. 알아채기는 커녕 오히려 저자가 진짜로 그런 의도로 쓴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저자 스스로가 이 작품을 어디까지나 ‘형제 간의 보편적 연대와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이다.
형제애나 가족애 측면에서는 꽤나 암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상처받고 망가져 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파탄에 이르는 가족의 이야기는 그들이 전혀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애틋하게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