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 쏜(Sally Thorne)’의 ‘헤이팅 게임(The Hating Game)’은 꽤 볼만한 직장인 로맨스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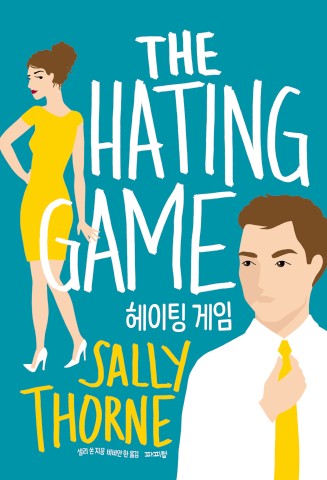
참 유치찬란도 하다. 다 큰 성인이, 그것도 공적으로 일하러 회사에 나와 자리에 앉아서는 사사건건 맞부딪히며 너는 어쩠네 나는 저쩠네 이번엔 너의 승리네 흥이네 해대는 게 마치 ‘초딩’들이 그러하는 것 같아서다.
누가보면 철천지 원수라도 되나 싶겠다만, 사실 이들이 이러는데는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굳이 꼽자면 어쩌다가 합병된 두 회사의 두 CEO의 각기 상대편의 비서라서 뭔가 좀 겹치는 위치에 있다는 거랄까. 소위 말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라는 말이다. 지금 당장은 두 CEO가 공동으로 존재하고 비서도 서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둘 중 하나는 정리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직업적 긴장감은 별 다른 설명도 없고 딱히 그래야만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의 은근한 경쟁과 경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게 쪼그맣고 좀 특이한 주인공 ‘루시 허튼’의 유별날 수 있는 점들을 은근히 잘 뭉개준다.
사실 주인공 루시는 그렇게 현실적인 캐릭터는 아니다. 모든 것을 게임으로 바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착각에 쉽게 빠지는 점이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것까지도 다분히 만화적이기 때문이다.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싶을만큼 매력적인 상대방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지만.)
주인공이 이렇다보니 소설은 자연히 착각물의 성격도 띄는데, 저자는 이걸 이용해서 대놓고 독자들은 알아챌만큼 힌트를 퍼주면서도 정작 등장인물들의 본심이나 관계는 잘도 꼬이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고전적인 장치들은 전형적이라서 어떻게 될지가 좀 뻔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다고해서 그게 극의 재미를 크게 깍아먹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티격태격하는 걸 구경하는 것도 썩 나쁘지 않다.
대부분의 상황을 가볍게 그려내면서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런 류를 좋아한다면 나름 재미있게 볼 만하다.
아쉬운 것은 주인공이 자신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나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겉 태도를 바꾸는 과정이 썩 매끄럽지 않다는 거다. 마치 특정 사건 하나를 기점으로 바뀌 것처럼 그렸기에 얼마나 쌓인 감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인지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말투 번역이 어색한 것도 한몫 한다. 철저하게 존댓말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구처럼 자연스레 반말을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주인공들의 심리 문제를 너무 허무하게 넘기는 것도 단점이다. 그게 그렇게 쉽게 해소될 거였다면 애초에 그정도로 심각해져선 안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충분히 그럴만한 주변인들이 있었기에 더 그렇다. 그래서 좀 쓸데없이 덧붙인 요소로 비치기도 한다.
나름 인기를 끌어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영상화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