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 라킨(Allison Larkin)’의 ‘에이프릴은 노래한다(The People We Keep)’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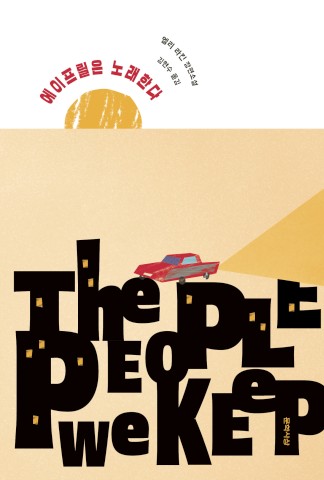
‘가족주의’라는 게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무리, 즉 가족이라는 단위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일이 많고, 때론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주입하려고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무리 즉 마을이나 국가같은 단위까지 그런 개념을 적용하려고도 한다.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많다. 조상 숭배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유교를 국교로 건국한 조선이 전신인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작 그런 나라들조차 가정폭력이 흔하고, 살인 역시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많이 벌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가족주의란 실로 허무한 주장처럼 느껴진다.
가족주의를 내세우는 것들은 썩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없다. 절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진짜 혈연끼리도 개거지같은 일들을 벌이는 인간들이 더 넒은 범위로 가족같은? 가당키나 하겠나. 대부분은 가,족같다 하는 뒤틀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대부분이다. 신파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헐리우드식 가족주의를 뻔하고 클리셰적이며 다분히 선동적이기도 한 일종의 판타지로 보는 것은 그래서다.
그런가하면, 놀랍게도 생판 남에게서 그런 판타지에나 존재할 줄 알았던 따뜻함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혈연에게서도 냉혹함밖에 맛볼 수 없었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보내는 사랑이 진짜일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게 대부분은 정답이기도 하고.
그러나, 개중에는 정말로 진심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실로 대단한 행운, 일종의 기적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단지 그것을 현실적으로만 그려낸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음악에 대한 재능을 부여하는 등 몇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이야기로서의 재미도 갖춘 편이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세부적인 묘사나 상황 등이 선뜻 와닿지 않는 점도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잘 읽히고 공감도 할만한 소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