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리샌드 1: 하늘을 나는 아이’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한 소녀가 신기한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겪게되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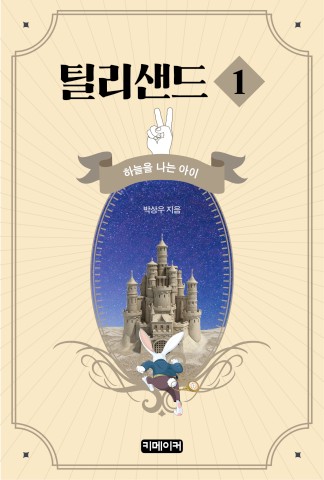
참 고민하게 된다. 이 걸 뭐라고 평 하면 좋을까.
보는 내내 ‘이게 대체 뭐지?’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건 1권을 꿋꿋이 다 보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더 뭐라 해야할지 어려워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마치 동화같은 이야기처럼 보였다. 꿈꾸는 소녀가 진짜 환상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점차 이야기가 커져가는 것도 일반적인 판타지 문학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하지만, 그 상세에서는 문제가 너무 많이 보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상한 문장이다. 마치 퇴고를 거치지 않은 듯한, 그래서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글들이 많다. 묘사가 부족하다거나 표현이 아쉽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다. 문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부정문과 이중부정문을 반대로 쓰는가 하면, 엉뚱한 부사를 써서 앞뒤가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는 것도 흔하다. ‘그러자’와 그 축약인 ‘~자’는 말버릇인 듯 걸핏하면 나와 지루할 정도다. 단어 선택이나 그 나열도 어색해서 마치 외국어를 번역기로 돌린 것 같은 문장도 많다.
내용도 이상하다. 조금 전에 그렇다고 해놓고는, 금세 아니라고 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것도 있고, 그 전까지의 대화나 행동에서 전혀 이어지지 않는 화제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것도 잦다.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에 핍진성이 있긴 어렵다. 그러다가 심지어 보여주지 않은 상황과 설정으로 갑작스레 전환하여 난해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해서, 이에 이르러서는 (전자책)파일이 깨지기라도 한 건가 의심이 들기도 했다.
이야기라는 건 마치 건축물과 같다. 시대, 장소, 세계관 등의 배경 설정, 등장인물, 그들이 입때까지 살아온 삶 등이 단단한 지반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것과 연결성이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계기를 통해 사건이 촉발되어야 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핍진성이 있는 흐름으로 다음 사건이나 이야기로 이어져,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확고한 층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아랫층을 지지삼아 풍파에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으며, 꼭대기에 다다른 독자에게 일종의 희열감을 선사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지반 공사를 좀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1층 터에 벽돌을 좀 놓고는(심지어 뭉쳐 쌓은 것도 아니다), 급작스럽게 2층을 올리려 한다.
무려 5부작으로 만들었으면서도, 그걸 막 시작한 1권에서 왜 이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 구성을 좀 가다듬고, 퇴고를 거쳐 문장을 충분히 다듬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