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피 헌터’는 세 편의 단편을 담은 소설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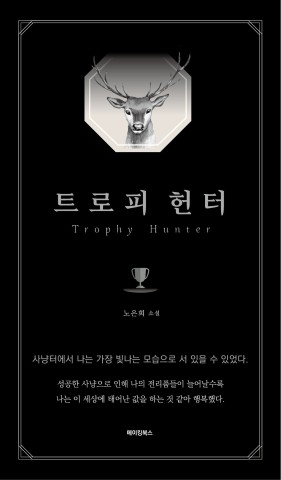
사냥과 박제, 종교 등 조금씩 다른 소설을 생각나게 하는 요소가 있어서일까. 분명히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세 소설에서는 묘한 일관성이 느껴진다.
그것은 각 작품이 풍기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록작들은 모두 상당히 음울한 편이다. 주인공들은 모두 어떤 결핍을 갖고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채거나 쉽게 채우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마냥 그러함에만 절어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끝에는 모종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모종의 희망을 엿보이게도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설사 조금은 어긋나 있거나, 일발의 행위로만 그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면모는, 결국엔 끝내 회복되지는 못하리라는 느낌을 남기는 ‘트로피 헌터’에서보다 관계의 지속과 호전을 암시하는 ‘부활’이나 나름 큰 변화도 기대해볼만 하게하는 ‘똘뜨’에서 더 두드러진다.
그에 맞춰 종교색도 더 진해지는 게 재미있는데,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의지할만한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이나 이해가 없다면 쉽게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상황은 얼핏 특수해 보이지만 의외로 평범하고 대중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품고있다.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관계과 집착 등은 독자에게도 자신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한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고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