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기다려’는 정체성 문제를 담은 소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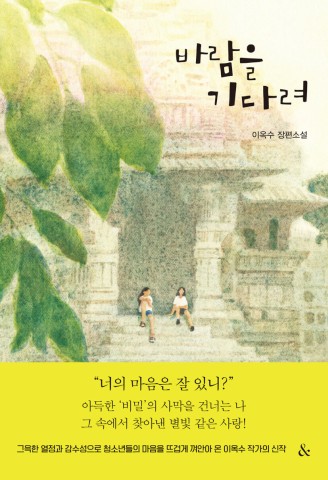
보통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정확하게는 기억이 있는 때)부터 부모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식으로 얼마나 어떤 감정을 쏟아왔는지를 성인이 되어 어설프나마 독립이라 할만한 생활을 꾸리게 될 때까지 싫어도 느낄 수밖에 없는 성장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한 어무니 아부지의 자식, 소위 족보라는 분명한 뿌리를 가진, 반만년의 건국신화로부터 이어지는 무슨 성씨의 후손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확고한지 알았던 믿음에 금이 간다면? 심지어 그게 누구보다 믿고 따르던, 가장 가깝게 사랑했던 사람의 발언에 의해서라면?
설사 가상으로라도, 단지 상상만으로도, 그런 상황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연히, 그럼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것 같고, 그런 중대한 일을 숱한 거짓말들로 채워온 혈연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알수없는 거리감과 어색함, 이유없는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객기처럼 치밀어오르는 반발심도 일지 않을까.
이런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을만한, 긴장과 고민이 함께하는 심정을 저자는 꽤 잘 담았다. 전혀 다른 얘기인 것처럼 시작해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잘 한 편이다. 너무 잘해서 쉽게 상상이 가기에 지나치게 뻔해보이기도 한다만, 이건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 쉽게 공감할만한 상황과 이야기를 그려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게 이 소설을 모두 설명하는 것 같다. 전개가 너무 뻔해서 식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쉽고 공감할만한 대중적인 감성을 자극하기에 나쁘지는 않다는 것, 심지어 전혀 다른 상황인 사람들도 공감할만한 감성을 담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익숙해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과 끝이 다소 신파적이고 느슨하다는 것은 아쉽다.



